본문 영역
INSIGHT
우리는 수십 수백 개의
동네에 산다
2025.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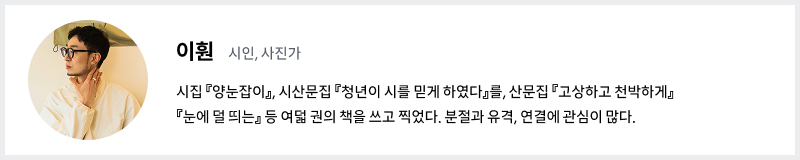
주거 지역이 곧 동네로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다. 한때는 개인의 지역은 곧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다. 걷거나 차에 올라타 자주 방문하는 익숙하고 내가 관계 맺은 적 있는 시공간이 동네였다.
불과 이십 년도 되지 않아 내 안에서 동네의 개념은 변모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이 머무는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로컬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발 닿는 곳 너머로 그것은 확장되었다. 물리적으로 관계 맺은 시공간뿐 아니라 시청각적으로 감각하며, 여러 플랫폼을 통과하며 만난 여러 대상이 우리의 주된 반경이 된 것이다. 이동하지 않고도 만남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모바일 덕분에 우리는 수십, 수백 개의 동네를 갖게 되었다. 하나의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동시에 움직이는 주체로서 세계를 활보하게 되었고, 동시에 지역에서 생겨나는 언어와 서브컬처에 영향 받는 객체로서 동네의 반경이 넓어지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속한 이용자 때문에 순식간에 동네가 늘어난다. 또 사라진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어지고 또 흩어지고 있나.
📍 가장 많이 만나는 이미지가 곧 나의 지역

얼굴 모르는 인간의 서재에 자주 간다. 들어가본 적 없지만 그의 집은 절벽 끄트머리에 자리해 있다. 그 서재에 설치된 커다란 통창 덕분에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주변 산세를 구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날의 기후의 한 가운데 들어서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안개가 끼면 공중에 떠 있는 서재에서 함께 무언가 읽고 싶은 기분에 휩싸이고 폭우가 쏟아지면 서재 창 위아래로 세찬 빗물로 뒤덮인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살펴보고 홀린 듯 다시 돌아가는 그 서재는 내가 요즘 가장 자주 되돌아가는 동네다. 집을 한 번도 나서지 않은 날에도 거길 자주 다녀온다.
낯익은 고양이가 손바닥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걔가 가진 짧고 두툼한 꼬리 때문에, 작은 황토 행성을 닮은 무늬 때문에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영상 매체에서 처음 봤던 게 오 년 전인데,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모바일로 마주친다. 제법 중후한 노묘가 되어가는 동안 꾸준히 사진과 영상으로 그를 맞닥뜨렸다. 이미 집에서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만남은 왜인지 내 생활 반경 깊숙이 자리잡았다.
반복되는 이미지는 꾸준하게 몸으로 반응하는 행위인 동시에 몸 안으로 들이는 것이기도 해서일까. 자주 만나는 이미지가 내 동네 같다고 자주 느낀다. 해서 점점 무엇을 볼지 더욱 의식적으로 결정할 필요도 느낀다. 온라인 공간은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을 알아보고 그 성향을 기반으로 몰랐던 옆동네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렇게 디지털 산책을 하는 동안 나에게는 여러 갈래의 산책로와 공원들이 생겨난다. 내가 점유한 곳, 새로 발견하고 가까이 두는 대상들은, 두 손 내딛어 거의 어디든 도착하는 디지털 인간에게 광활한 동네가 된다. 그것은 우리 생활 깊숙이 관여하는 동시에 한 뼘만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존재한다. 언제든 새 동네를 탐닉 가능한 시대로 들어선 거다.
💬 온라인에서 빠르게 모이고 뒤섞이는 언어들

텍스트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문장에 기대어 짧게는 하루를, 길게는 한 시절을 건너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된다. 언어는 정말로 우리가 머무르고 붙잡을 수 있는 물리적인 매개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영혼이 기댈 곳 없었던 때 나는 허수경 시인의 시와 산문을 읽으며 어디서도 받지 못한 위로를 얻었다. 그 시절 그의 문장들이 곧 내가 서식하는 지역이었다.
책 덕분에 주로 이 같은 경험을 해왔지만 이제 텍스트는 어디서든 도착한다. 웹, 이메일, 뉴스레터, 광고, 포스터와 필사 이미지 등 다양한 데서 우리를 이루는 언어가 채집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들여야 하기도 하지만 문장에 반응하는 이들은 어느 때보다 많이 읽을 수 있다. 한 자리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섭식할 수 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화면으로 책을 읽고 시를 받아 읽고 오래된 문서를 열람한다. 기사를 한 곳에 모아둔다. 종이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작가이지만 화면 속 문장 앞에서 나 또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여러 권을 챙길 수 없는 날에도 이제는 기기 하나에 서재의 커다란 일부를 데려갈 수 있다. 밑줄 친 문장들을 모아보기도 한다. 사전이자 문헌, 두터운 수십 만 권의 책을 모두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 시기 우리가 속한 집단이자 동네로써 기능한다. 모바일 안팎으로 만나고 다양하게 아카이빙되는 그 문장들이 곧 우리고 그곳이 우리의 반경이다. 빠르게 모이고 뒤섞이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된다.
🏘️ 동네의 개념은 시절마다 변모한다

‘당근마켓’, ‘우주펫’, ‘해주세요’ 등 지역 기반 앱이 만들어내는 동네
가 닿을 수 있는 지도가 늘어난다. 자주 도착하고 누비는 영역의 의미도 함께 변모 중이다. 동네는 물리적인 것에 더는 국한되지 않는다. 한때 동네는 손 닿는 곳에 머무는 자리였다.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도 제한적이었다. 커뮤니티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어느 정도의 폐쇄성을 띄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많은 이들이 앱 속에서 진입 가능한 동네를 갖게 되었다. 다수가 함께 짓고 또 해체한다. 그 변화의 물결 가운데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동네들은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 때문에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정릉 지역에 사는 여러 개인의 사정을 알게 되고 주민들이 나누는 시시콜콜한 안부 -- 이를테면 정릉천에 살던 오리가 새끼를 열 마리나 낳았다는 사실 -- 때문에 이 동네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됐다. 모르는 개인의 역사가 쌓인 물건도 저렴하게 여럿 들였다. 인간과 생활이 뒤섞이는 순간이다.
한편 동물 돌봄 품앗이가 가능한 ‘우주펫’ 등의 어플로 반경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장시키고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돌 때는 대륙 건너에 머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동네에서 크고 작은 심부름을 감당하는 어플에서 시작해 일상 커뮤니티 역할까지 해주는 ’해주세요’ 등이 생겨났다. 우리가 공간 뿐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까지 동네의 또다른 축이 된 거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원을 대체해주는 수단까지가 동네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동네의 지리로써 기능하는 걸 넘어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역할로 기능하고 있는 모바일에서 보내는 시간을 운용하는 방식이, 이 시대 나의 로컬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선택이다. 어디까지가 ‘나’이기로 할지는 거기서 결정된다. 이 글을 맺으며 하나의 공원을 접고 다음 동네로 향한다. 신호등과 보도가 될 준비를 마친 채로.